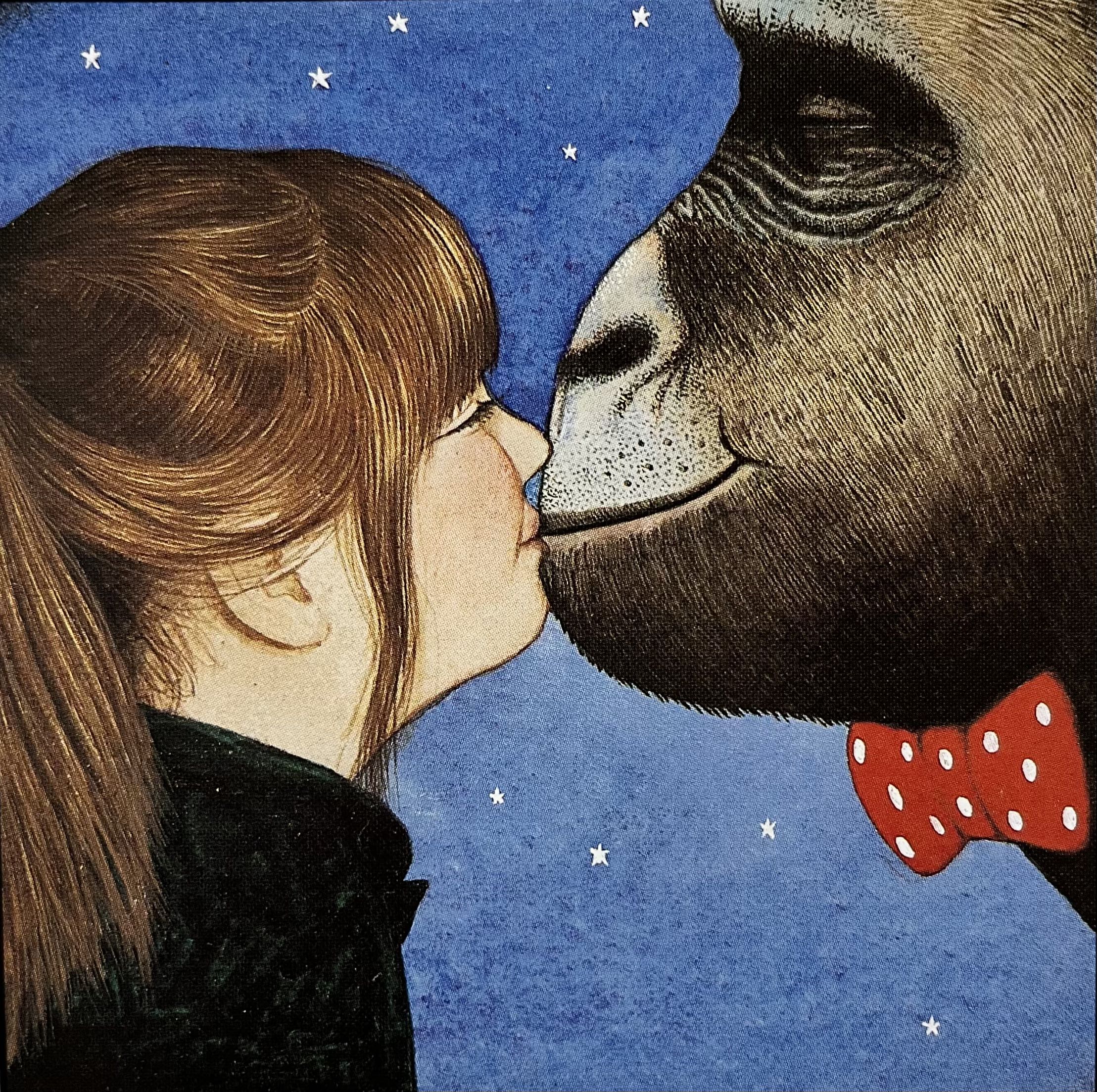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마음챙김의 시
- 가을 시
- 너를 모르는 너에게
- 위로시
- 윤홍균
- 자존감수업
- 봄에 읽기 좋은 시
- 희망시
- 자존감
- 겨울시
- 힐링 그림책
- 그대 꽃처럼 내게 피어났으니
- 멀리 가는 느낌이 좋아
- 윤동주
-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 나태주
- 류시화
- 자존감회복
- 주민현
- 나선미
- 외모 자존감
- 사랑시
- 좋은시
- 감성시
- 힐링그림책
-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 가을시
- 미움받을 용기
- 시가 사랑을 데리고 온다
- 그리움의 시
- Today
- Total
때는 봄, 봄날은 아침🌿
책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07남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 본문
# 7강
남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
남에게 인정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야 남들도 나를 인정한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묻는 것과 같다.
낙관적인 것과 '낙천적'인 것은 다르다. 낙천적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는 0일 것이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집요하게 노력하지 않고,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게해 부담을 주기도 한다. 반면 낙관적인 사람은 좋은 일을 최대로, 나쁜 일은 최소로 일어나도록 생각을 조직하고 행동에 옮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아 개념을 가진 우리
우리나라는 '우리' 개념이 강한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나의 엄마를 우리 엄마, 혼자 사는데도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국가도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큰 자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나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야 인정은 받지 못해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FOMO Fear Of Mising Out 중후군, 즉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증상.
인정 투쟁이 가장 강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투쟁' 이라고도 한다. 독일 철학자 악셀 호네트Axel Honneth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인간은 타인이 나를 자립적인 가치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나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악셀 호네트는 인정투쟁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한 주체는 다른 주체에게 인정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새롭게 획득된 정체성은 더 높은 인정에 대한 요구를 불러 일으킨다.
여러 심리학자의 연구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인정 투쟁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가장 불안해하는 문화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립할 수 있다.
내가 상무한테 인정받으면 부장한테 인정받은 것보다 더 강하게 인정받은 것이고, 1명보다 10명한테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셈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인정투쟁 욕구가 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라고 하는 강한 공동체 문화를 지닌 나라에서는 그 인정투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감탄하기
심리학자 김정운 박사는 인정투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그 삶을 투쟁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인정투쟁보다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남의 감탄' 입니다. 인간은 감탄하고 감탄을 받으려고 살아요."
인정받고 싶다는 건 남이 나에게 "우아, 대단한다. 멋져요. 최고예요" 라는 말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이다. 인정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남의 감탄을 듣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의 감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가 나에게 감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나자신에게 감탄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감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자신에게 감탄하는 방법
자신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경우, 나에게 감탄할 수 있다. 예전에는 못 쓰던 붓글씨를 잘 쓰게 되었다거나 피아노를 배워서 노래 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등 본업과 무관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글쓰기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스포츠든 취미활동을 하면서 성취 경험을 하는 것이 나자신에게 감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다.
자존감이 적절하게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적 행동이 있을 때 자존감이 더 높아진다. 직접 글을 쓰고 노래를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는 것.
철학자 니체 Friedrich Nietzsche는 이렇게 말했다.
"한 번도 춤추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니체는 자신의 본업인 철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춤을 추면서 스스로에게 감탄할 수 있었다. 춤을 매우 사랑한 니체는 알프스 산자락을 춤추며 다녔다고 한다. 이처럼 일과 상관없는 체험에서 나 스스로에 대한 감탄을 만들어내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밑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동료, 상사, 후배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아, 이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대부분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지만 문화적 삶에서도 성취해봐야 한다. 문화적 성취가 나를 더 인정받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꼭 일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감탄해야 하는 이유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감탄하려면, 훌륭하게 일 처리를 하거나 경쟁 상황에서 1등을 해야 한다. 일에는 경쟁이 있고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감탄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눌러 이겼다는 뜻이다. 처절한 투쟁이 필수다. 반면 일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서는 성취하기가 쉬울뿐더러 비용이 덜 든다.
문화 활동에서는 경쟁이나 순위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해서 노래 한 곡을 잘 연주해보자. 그때 나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몇 등일까? 세계에서 1억 등쯤 할 것. 우리에게 순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피아노 연주를 본업으로 삼고 있지 않고, 나만의 기준에 만족하고 해낸 것에 의미를 두니까.
일과 상관없는 문화 활동에서 나에게 감탄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도 긍정적이다. 문화 활동에서 얻은 감탄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에 전염되어 일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되는 것. 물론 남의 감탄을 받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나 스스로에게 감탄해주고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준다면 인정투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리라 기대한다.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 저녁달

#😇적용해보자
1. 스스로를 인정해주기
2.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3. 스스로에게 감탄하기 / 타인에게 감탄해주기
4. 본업과 무관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성취감 느끼기
'힘이 되어 줄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09먼저 다가가기 위한 작은 행동 (0) | 2023.06.30 |
|---|---|
| 책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08쉽게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법 (0) | 2023.06.28 |
| 책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06행복이란 무엇인가 (0) | 2023.06.23 |
| 책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05관점이 다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0) | 2023.06.21 |
| 책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04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 (0)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