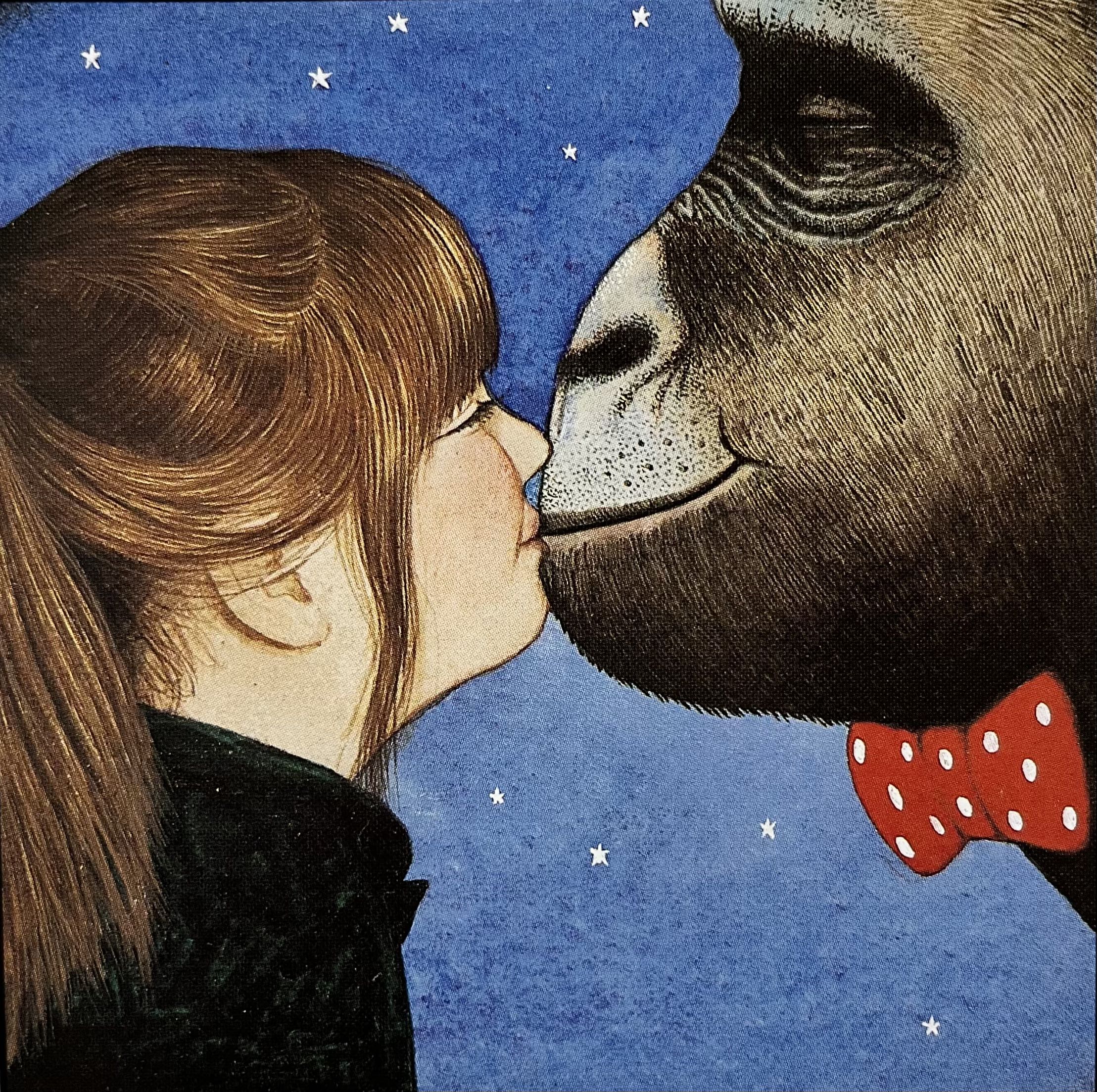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외모 자존감
- 사랑시
- 주민현
-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 나태주
- 윤동주
- 류시화
- 시가 사랑을 데리고 온다
- 윤홍균
- 겨울시
- 너를 모르는 너에게
- 멀리 가는 느낌이 좋아
- 위로시
- 미움받을 용기
- 감성시
- 좋은시
- 가을 시
- 힐링 그림책
- 가을시
- 자존감회복
- 희망시
- 힐링그림책
- 그리움의 시
- 봄에 읽기 좋은 시
- 자존감
- 자존감수업
- 마음챙김의 시
- 나선미
-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 그대 꽃처럼 내게 피어났으니
- Today
- Total
때는 봄, 봄날은 아침🌿
책 <미움받을 용기> #14변명으로서의 열등 콤플렉스 / 기시미 이치로 본문
변명으로서의 열등 콤플렉스
열등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킨다.
아들러도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인정했다. 열등감 자체는 조금도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일까? 그건 순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보편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아들러는 이를 ‘우월성 추구’라고 하였다. 간단히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아장아장 걷는 아기는 두 발로 서게 되고, 말을 배워서 주변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지길 바라는 보편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인류사 전체를 보자면 과학의 진보도 ‘우월성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열등감이다. 인간은 누구나 더 나아지길 바라며 우월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어떠한 이상과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향해 전진한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모자라다고 느끼게 된다.
피아노 연주자의 경우 그 뜻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전히 서투르다” “더 깊은 음률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일종의 열등감을 안고 있다. 아들러는 ‘우월성 추구도 열등감도 병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하기 위한 자극이다’하고 말했다.
열등감도 제대로만 발현하면 노력과 성장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내면에 자리한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 더욱 전진하려고 한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한다. 열등감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 발 내딛을 용기도 내지 못하고 ‘상황은 현실적인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차피 나 같은 건.’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라며 포기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건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 콤플렉스이다.
주의하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콤플렉스’라는 말이 열등감과 같은 말처럼 쓰이고 있다. 원래 콤플렉스란 복잡하게 얽힌 도착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열등감과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가 제기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만 봐도 동성 부모에 대한 도착적인 대항심이라는 맥락으로 파악된다. 마찬가지로 ‘열등감’과 ‘열등 콤플렉스’도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야 한다.
열등감 자체는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아들러도 말했듯이 노력과 성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가령 학력에 열등감을 느껴 “나는 학력이 낮다, 그러니 남보다 몇 배 더 노력하자”라고 결심한다면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나.
하지만 열등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나는 못생겨서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A라서 B를 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미 열등감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그것은 열등 콤플렉스이다. 학력이 낮으면 취직자리도 출세의 기회도 얻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과관계에 관해 아들러는 ‘무늬만 인과법칙’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원래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 것을, 마치 중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납득한다고 말이다.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한 탓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프로이트의 원인론 관점에서 보자면 부모의 이혼은 큰 트라우마이자 그 사람의 결혼관과 밀접한 인과관계에 놓여있다.
하지만 아들러는 목적론 입장에서 그것을 ‘무늬만 인과법칙’이라며 경계하였다. 문제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령 당신이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한다. 간단히 말해 한 발 앞으로 내미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예를 들면 놀거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희생해서까지 변하고 싶지 않다, 즉 생활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유스럽지만 지금 이대로가 더 편한 것이다.
기시미 이치로 / 고가 후미타케 「미움받을 용기 」 인플루 엔셜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아들러는 우월성 추구라 불렀다.
나의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을 인지할 때 느끼는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열등감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듯 열등감과 우월성추구를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열등감과 열등컴플렉스를 구분해야한다. 할 수 없는 것과 하고싶지 않은 것을 제대로 답해야한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무책임한 일이다.
그러니 제대로 답하고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내야해.
Alfred Adler (1870 ~ 1937)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힘이 되어 줄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 <미움받을 용기> #16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 / 기시미 이치로 (0) | 2023.08.23 |
|---|---|
| 책 <미움받을 용기> #15자랑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 기시미 이치로 (0) | 2023.08.21 |
| 책 <미움받을 용기> #13열등감은 주관적인 감정이다 / 기시미 이치로 (0) | 2023.08.16 |
| 책 <미움받을 용기> #12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 기시미 이치로 (1) | 2023.08.14 |
| 책 <미움받을 용기> #11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가 / 기시미 이치로 (0) | 2023.08.11 |